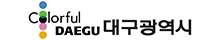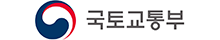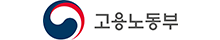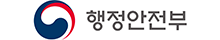판례 지하주차장 계단서 넘어져 다친 후 사망…“입대의 배상해야” [김미란의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의 경위
가. F는 2022. 1. 24.경 본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 부상을 입었다(이하 ‘사고’). 이후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가료하던 중 2022. 2. 27. 가슴을 조이는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22. 2. 28.경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계단을 관리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고, 육안으로 계단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F의 사망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F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F의 자녀 3인(이하 ‘유족’)은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계단의 점유자며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최하단을 22㎝로 높게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다. 법원은 입대의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경위,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가. 공작물 책임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작물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고, 만일 위험이 현실화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의 구비 여부 판단은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공작물 책임 인정
아파트 주차장의 계단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인 입대의가 관리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공작물 점유자라 할 수 있으므로 입대의는 계단 부분을 점유 및 관리하는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준공 당시 시행 중이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 높이는 18㎝ 이하로 규정돼 있고, 사고가 일어난 계단을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최하단 계단 높이를 다른 계단보다 높이 설치 및 관리한 사실, 사고 후 최하단 계단 아래 계단참에 매트리스 발판을 설치했음에도 위 규정이 정한 18㎝를 4㎝나 초과한 22㎝에 달해 그 전에는 단 높이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근에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F가 발을 헛디뎌 골절된 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대의는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들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로서 2억2147만4000원을 인정하고 사고 경위, F의 부주의 등에 비춰 책임비율을 70%로 정해 1억5503만1800원 인정, 위자료로서 F의 위자료 5600만 원, 자녀들 각 700만 원으로서 합계 7700만 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입대의는 유족들에게 각 7734만3933원[=2억3203만1800원(=1억5503만1800원+7700만 원)÷3]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석
공작물 책임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작물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게을리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니 사망 사고라면 공작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았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새벽녘 빙판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관리주체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점을 충분히, 소상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라 무척 애를 썼었다.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건설사라는 점에서 관리주체로서는 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에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가 기울인 각고의 노력과 충분한 방호조치 여부가 면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법원이 공작물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만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관련링크
- 이전글‘기준일자 착오’ 최저가 입찰 탈락 업체 손배청구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25.10.16
- 다음글재건축추진위에 입주민 개인정보 제공해도 되나 25.1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